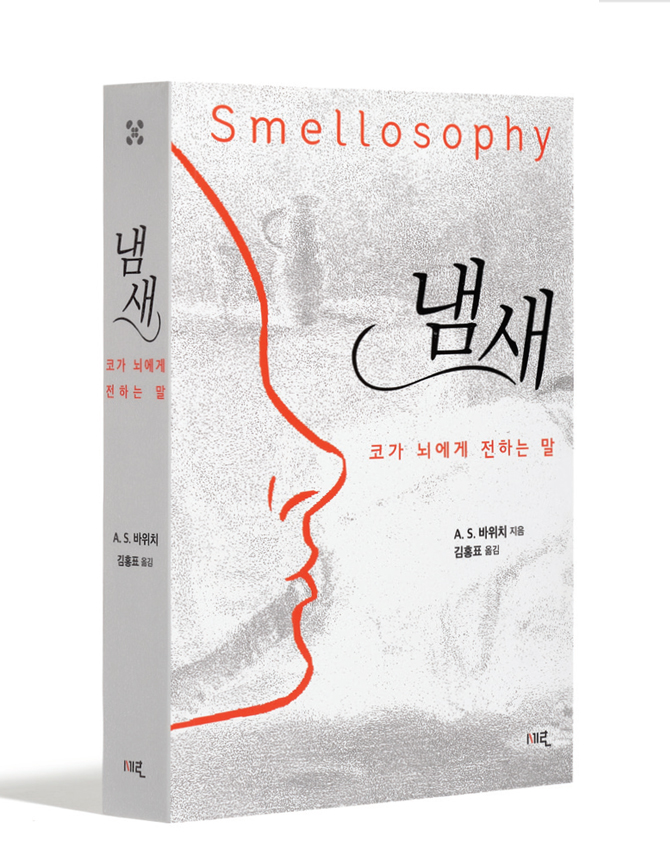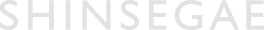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라벨 ‘볼레로’
‘완벽한’ 커플의 음악
2021/02 • ISSUE 33
writerChoi Jeongdong 〈중앙일보〉 기자
©Photo by David Madison / Getty Images
프랑스 출신 지휘자 샤를 뮌슈가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해 녹음한 ‘볼레로’.
대표적인 명연주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세계앱으로 연결되며,
신세계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오른쪽 뮤직 아이콘 선택 시 ‘볼레로’를 감상할 수 있다.
군 복무를 한 곳은 동해 바다에서 멀지 않은 경북의 소읍이었다. 후방이지만 부대의 특성상 휴전선을 지키는 육군과 비슷한 생활을 했다. 해가 지면 무장을 하고 나가 참호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새벽이 밝으면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오전에는 잠을 자고 오후에는 땅을 파거나 축구를 했다.
밤에 M16 소총을 들고 매복호에서 보초를 서는 일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내 젊음이 철조망에 갇혀 시드는 것 같았다. 위안이 된 것은 계절의 변화였다. 예전엔 무심하던 풍경들이 새삼스레 눈부셨다. 이른 봄, 대지가 아직 갈색으로 메말라 있을 때 붉은 진달래가 안개처럼 온 산을 뒤덮었다. 초여름에 보리가 익으면 들판은 황금색으로 일렁였다. 막사를 둘러 피는 코스모스,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겨울 안개도 가슴을 시리게 했다. 밤하늘 북두칠성이 기울면 새벽이 밝아오고, 달이 둥글게 부풀었다가 그믐달로 여위면 한 달이 갔다.
내가 본 것은 영국 커플 제인 토빌과 크리스토퍼 딘의 프리댄싱이었다. 때는 1984년, 사라예보 동계 올림픽이었다. 그날 두 사람의 연기를 보고 놀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심판 9명 전원이 예술 점수 6.0 만점을 주었다. 중계방송 캐스터는 “믿을 수 없다(Marvellous)”라고 몇 번이나 외쳤다. 흥미로웠던 것은 주인공 토빌과 딘의 반응이었다. 기록적인 점수를 받고도 둘은 담담하게 포옹했을 뿐이다. 그들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두 사람에게 사라예보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예술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무대였던 것이다.
그들의 아이스댄싱을 그 뒤 한 번 더 TV에서 봤다. 더 이상 젊지 않고 기량도 예전만 못했지만 토빌과 딘은 얼음 위에서 옛 모습을 재현했다. 여전히 감동적이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중이었는데, 모두 커다랗게 6.0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두 사람을 응원했다. 그들에게 토빌과 딘은 영원히 ‘예술적으로 완벽한’ 커플이었던 것이다. 나도 청중과 같은 마음이었다.
내가 본 두 번의 댄싱에서 그들이 선택한 음악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였다. 전개도 변주도 없이 시종일관 같은 멜로디만 반복하는 그 야릇한 음악 말이다. 볼레로는 선율이 반복되긴 하지만 악기를 하나씩 보태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절규하며 무너져 내린다. 이런 진행은 어쩔 수 없이 성적性的 환상을 자극한다. 아마도 라벨이 의도했을 것이다. 초연 때 파리의 한 귀부인은 의자를 손으로 쥐어뜯으며 “라벨은 미치광이야” 하고 소리쳤다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라벨이 빙그레 웃었다고 하지 않는가. 볼레로 음반 중에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흥분해서 지르는 비명이 녹음된 것도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볼레로’가 전혀 섹시하지 않다. 샤를 뮌슈가, 레너드 번스타인이 아무리 뜨겁게 도발해도 마찬가지다. 점점 광포해지는 음향을 들어도 그해 겨울 끝까지 담백하던 영국 커플의 춤사위가 되살아날 뿐이다. 잿빛 병영에서 하루하루를 지워나가던 스물셋 청년이 뮤즈의 마법에 홀려 TV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모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