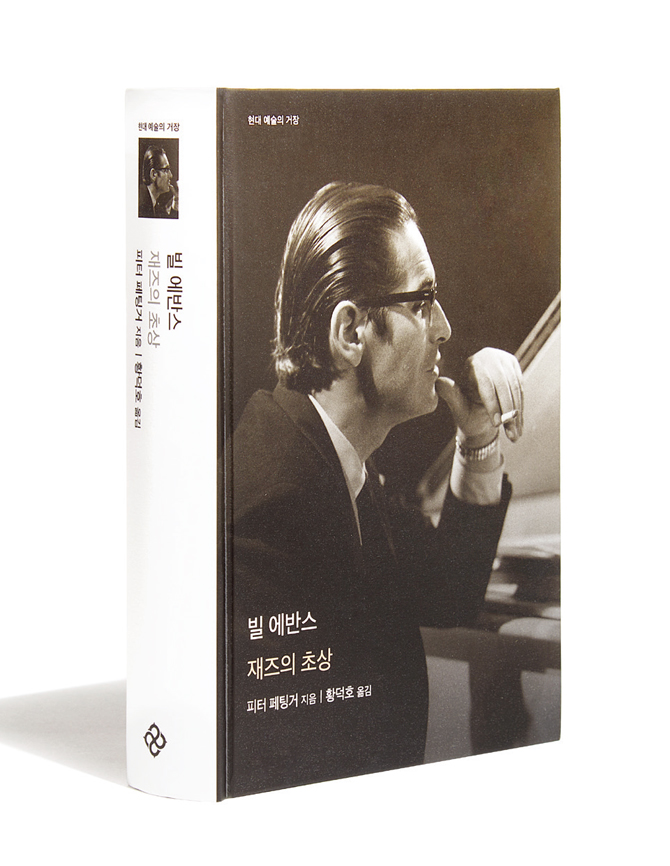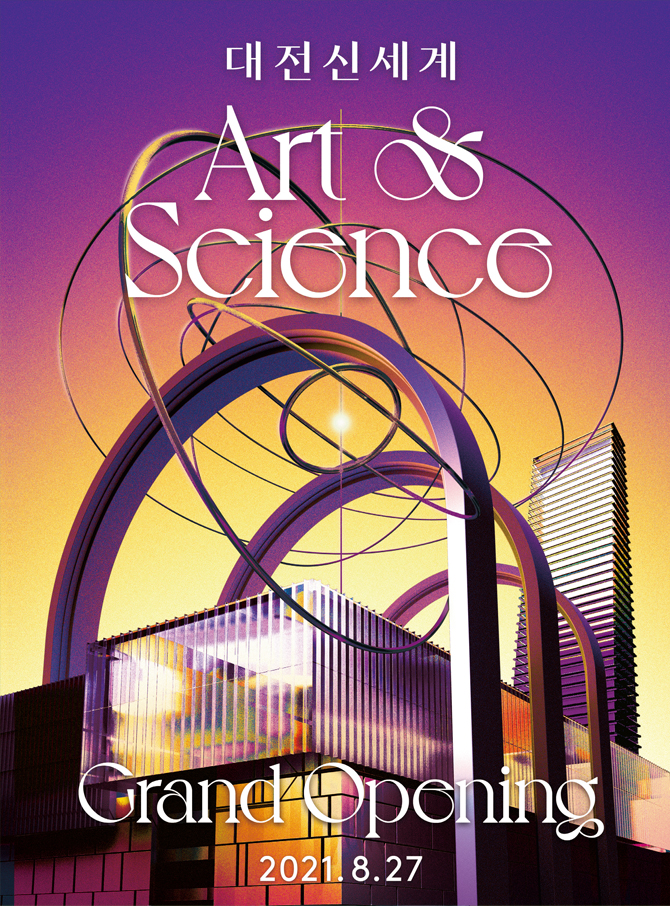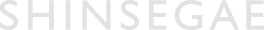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Culture
칸디다 회퍼
공간에 남은
인간의 흔적으로부터
2021/09 • ISSUE 39
writerKim Hyunho 사진 비평가, 〈보스토크 프레스〉 대표
editorJang Jeongjin
©Dalra Nam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이 작품은 2013년에 칸디다 회퍼가 찍은 뵘 샤펠Böhm Chapel의 사진이다. 창문 사이로 쏟아져 내려와 바닥에 반사된 빛은 표백된 것처럼 투명하고, 삼나무로 장식한 천장과 기하학적 문양이 그려진 바닥은 정교하고 섬세하다. 마치 그물처럼 불규칙한 창문의 금속 장식과 흰 곡선 벽, 그리고 여기저기 반사되는 빛이 교차되며 기이한 공간의 정서를 직조한다. 그 느낌은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가워서, 회퍼의 사진 앞에 선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곤 한다. 사진 속 뵘 샤펠은 한때 쾰른 대교구의 성 우르술라 구역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 고트프리트 뵘Gottfried Böhm이 아버지 도미니쿠스 뵘의 설계를 바탕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 교회가 완공된 것은 1956년으로 악몽과도 같았던 쾰른 대공습의 상흔이 완전히 아물지 않은 때였다. 완성된 건물은 단정하고 우아했다. 건축사가 헬무트 푸스브로이히Helmut Fußbroich는 이 건축물이 쾰른뿐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 이 교회 건물은 매각이 되어 리모델링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이다. 교회의 강대상과 세례반, 휘장은 철거되었고 조각품을 설치할 정원과 흰 벽이 생겨났다. 이제 이 건축물은 ‘뵘 교회(샤펠)’라는 이름의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된다. 성 우르술라의 작은 교회는 이제 필립 글라스가 피아노 독주회를 열고 패션 사진가 데이비드 라샤펠이 개인전을 갖는 장소가 되었다. 이 사진의 구석구석에는 종교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것이 뒤섞여 있다.
건축물 내부에 깃든 시간의 흔적에 주목하다
칸디다 회퍼는 건축물 내부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찍는다. 건축물은 대체로 그것을 지은 인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견뎌낸다. 만약 인간들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말이다. 교회가 미술관으로 바뀌듯 궁전이 관광지로 바뀌거나 공장이 카페로, 학교가 은행으로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다. 설령 용도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과 인간의 손길에서 자유로운 건축물은 없다. 따라서 건축물은 복잡하고 다채로운 인간의 흔적을 지니게 된다. 건축물을 다룬다는 소재적 유사성, 대형 카메라와 빛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기술적 특징으로 칸디다 회퍼의 사진은 흔히 현대미술의 범주에 속하는 건축 사진으로 오인되곤 한다. 그러나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닌 시간과 공간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의 사진은 통상적인 건축 사진과 전혀 다르다. 실제로 몇몇 인터뷰에서 칸디다 회퍼는 자신을 ‘건축 사진가’로 구분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기도 했다. 즉, 그는 건축물의 양식과 특징 그리고 그것이 지닌 건축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도시 풍경을 만들어내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따뜻한 자연광 아래 촬영한 회퍼의 사진이 다소 차갑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통상적인 건축 사진에 깃들기 마련인 여러 ‘인간적인’ 욕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섬세한 시선으로 사회적 초상을 담다
칸디다 회퍼가 처음부터 이런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다. 열여덟 살에 처음 사진을 찍은 그의 첫 직장은 고향 쾰른에 있던 작은 상업사진 스튜디오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신문사에 취직해 인물 사진을 찍었다. 리버풀에 출장 가서 시인을 찍기도 했고, 당시 유명한 상업사진가 베르너 보켈베르크Werner Bokelberg의 스튜디오에서 일하기도 했다. 칸디다 회퍼의 작업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1976년부터 뒤셀도르프의 쿤스트아카데미에서 베른트와 힐라 베허 부부에게 사사한 것이었다. 베허 부부는 사진과 미술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개념예술가이자 사진가였고, 무엇보다도 탁월한 교육자였다. 베허 부부 문하에서는 칸디다 회퍼를 비롯해 토마스 스트루스, 악셀 휘테, 토마스 루프, 안드레아 구르스키 등 여러 대가가 배출되었다. 한 학교에서 단기간에 세계적인 작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일도 드물지만, 이들 베허 학파Becher Schule의 작가들처럼 한 스승의 제자들이 제각기 다른 문제의식과 표현 방식, 강렬한 개성을 지닌 경우는 매우 희귀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형 프린트를 만들어내는 기술적 역량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고, 현대 예술사진의 조건인 미술사적 좌표 감각도 명확했다. 세기말 전후 이들 작가들을 앞세운 베허 학파의 영향은 막강했다. 당시의 한국 사진계 역시 그들의 중력에 의해 굴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악셀 휘테, 토마스 스트루스와 함께 칸디다 회퍼는 막 부임한 베허 부부의 첫 제자였다. 그는 베른트와 힐라 베허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언제나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이끌어나갔다고 말한다. 인물 사진 경험이 풍부했던 회퍼가 뒤셀도르프 시절 선택한 작업은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인을 찍는 것이었다. 독일은 1973년까지 ‘초청 노동자Gastarbeit’ 제도를 운영했다. 이는 외국인들이 독일에 와서 일하는 것을 허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이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독일에 머물렀다. 회퍼는 3백만 명에 달하는 터키 출신 이민자가 당시 쾰른 거리의 이미지를 변모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작의 제목인 <독일의 터키인Türken in Deutschland>에서 엿볼 수 있듯 회퍼의 관심사는 분명 터키 ‘사람들’이었던 듯하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들의 사회적 초상을 찍는 것은 분명 아우구스트 잔더August Sander에게서 비롯돼 베허 학파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독일의 사진적 전통에 맞닿은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터키인을 담은 회퍼의 사진에서는 머뭇거림이 느껴진다. 유난히 수줍음이 많아 낯선 이들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을 건네는 일조차 어려웠다고 회고하는 회퍼는 아우구스트 잔더 같은 사진가들과는 달리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듯하다. 제목과 달리 그의 카메라는 터키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보여주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대신 칸디다 회퍼의 시선은 당시 터키인이 조성한 생활공간을 천천히 맴돈다. 그는 터키인들의 벽지가 얼마나 묘하게 아름다운지, 바닥에 깔아둔 카펫이 어떤 패턴으로 짜여 있는지, 그들이 공간에 배치한 물건이 어떤 방식의 삶을 증언하는지 다소 서투르지만 섬세하게 짚어낸다. 어쩌면 이런 사진에서 인물이란 시선을 빼앗는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표정이 과연 공간에 놓인 사물과 흔적보다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까? 이 사진들은 과연 ‘터키인’을 찍은 것이 맞을까? 훗날 칸디다 회퍼가 건축물 내부를 찍은 자신의 사진을 ‘공간의 초상 사진’이라고 불렀듯 이 사진들 역시 터키인의 공간을 찍은 초상 사진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인물들이 없다면 공간의 모습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악셀 휘테, 토마스 스트루스와 함께 칸디다 회퍼는 막 부임한 베허 부부의 첫 제자였다. 그는 베른트와 힐라 베허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언제나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이끌어나갔다고 말한다. 인물 사진 경험이 풍부했던 회퍼가 뒤셀도르프 시절 선택한 작업은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인을 찍는 것이었다. 독일은 1973년까지 ‘초청 노동자Gastarbeit’ 제도를 운영했다. 이는 외국인들이 독일에 와서 일하는 것을 허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이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독일에 머물렀다. 회퍼는 3백만 명에 달하는 터키 출신 이민자가 당시 쾰른 거리의 이미지를 변모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작의 제목인 <독일의 터키인Türken in Deutschland>에서 엿볼 수 있듯 회퍼의 관심사는 분명 터키 ‘사람들’이었던 듯하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들의 사회적 초상을 찍는 것은 분명 아우구스트 잔더August Sander에게서 비롯돼 베허 학파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독일의 사진적 전통에 맞닿은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터키인을 담은 회퍼의 사진에서는 머뭇거림이 느껴진다. 유난히 수줍음이 많아 낯선 이들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을 건네는 일조차 어려웠다고 회고하는 회퍼는 아우구스트 잔더 같은 사진가들과는 달리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듯하다. 제목과 달리 그의 카메라는 터키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보여주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대신 칸디다 회퍼의 시선은 당시 터키인이 조성한 생활공간을 천천히 맴돈다. 그는 터키인들의 벽지가 얼마나 묘하게 아름다운지, 바닥에 깔아둔 카펫이 어떤 패턴으로 짜여 있는지, 그들이 공간에 배치한 물건이 어떤 방식의 삶을 증언하는지 다소 서투르지만 섬세하게 짚어낸다. 어쩌면 이런 사진에서 인물이란 시선을 빼앗는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표정이 과연 공간에 놓인 사물과 흔적보다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까? 이 사진들은 과연 ‘터키인’을 찍은 것이 맞을까? 훗날 칸디다 회퍼가 건축물 내부를 찍은 자신의 사진을 ‘공간의 초상 사진’이라고 불렀듯 이 사진들 역시 터키인의 공간을 찍은 초상 사진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인물들이 없다면 공간의 모습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물에서 공간으로, 칸디다 회퍼가 완성한 공간의 초상
<독일의 터키인>을 마무리한 회퍼는 더는 자신의 프레임에 사람을 두지 않게 되었다. 2019년 하버드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 아티스트 토크에서 회퍼는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작가가 자신의 의도나 작업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존재를 없애고 공간에 남은 흔적과 빛, 미묘한 공기의 감각에 집중하는 그의 이후 사진은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모호하지만 훨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일흔일곱 살이 된 칸디다 회퍼는 여전히 라인강이 내려다보이는 쾰른의 집에서 살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간의 초상’ 사진을 찍는다. 자신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예전의 화려하고 복잡한 역사적 건축물 외에도 그저 의자나 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일상의 작은 공간을 찍기도 한다. 이것은 그가 오래전에 찍던 터키인들의 공간 사진과 연결되는 것일까? 알 수 없다.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작업 스타일을 유연하게 변주하는 것 역시 베허 부부의 후예가 지닌 큰 강점이기도 하다.
올해 일흔일곱 살이 된 칸디다 회퍼는 여전히 라인강이 내려다보이는 쾰른의 집에서 살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간의 초상’ 사진을 찍는다. 자신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예전의 화려하고 복잡한 역사적 건축물 외에도 그저 의자나 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일상의 작은 공간을 찍기도 한다. 이것은 그가 오래전에 찍던 터키인들의 공간 사진과 연결되는 것일까? 알 수 없다.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작업 스타일을 유연하게 변주하는 것 역시 베허 부부의 후예가 지닌 큰 강점이기도 하다.
칸디다 회퍼,〈Böhm Chapel Köln I 2013〉 ©Candida Höfer/VG Bild-Kunst, Bonn.
칸디다 회퍼,〈Musée du Louvre Paris XXI I 2005〉 ©Candida Höfer/VG Bild-Kunst, Bonn.
"어쩌면 이런 사진에서 인물이란 시선을 빼앗는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표정이 과연 공간에 놓인 사물과 흔적보다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까?"
칸디다 회퍼, 〈Benrather Schloss Düsseldorf V I 2011〉
©Candida Höfer/VG Bild-Kunst, Bonn.
©Candida Höfer/VG Bild-Kunst, Bonn.
칸디다 회퍼,〈Untitled〉, Image from the series ‘Türken in Deutschland’ I 1979
©Candida Höfer/VG Bild-Kunst, Bonn.
ARTIST PROFILE
칸디다 회퍼(Candida Höfer)
독일의 사진가.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베허 부부에게 사사했다.
기술적 완벽성과 엄밀한 개념적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사적 공간에 관련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