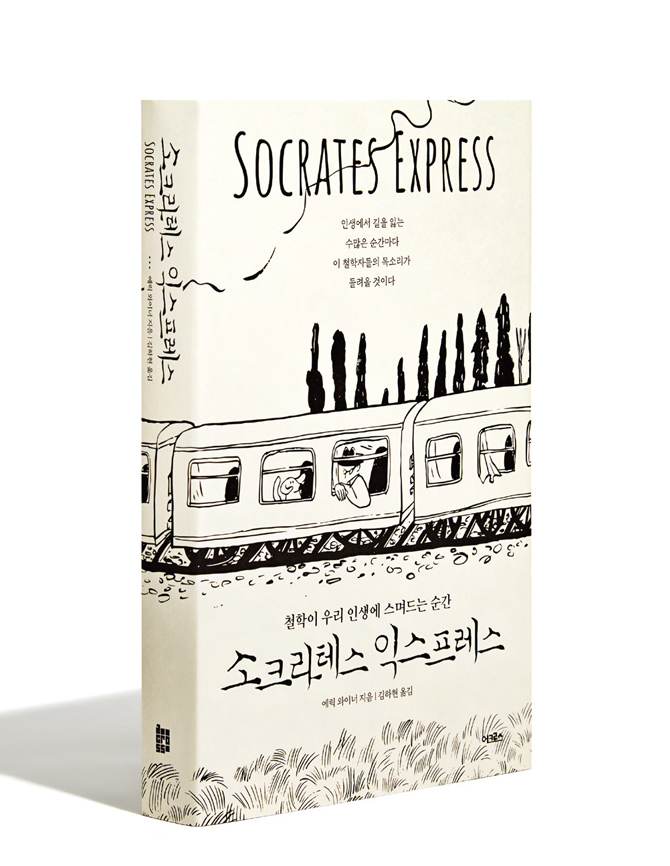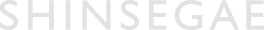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Culture
브루크너 후기 교향곡
길어서 고마운 음악
2021/11 • ISSUE 41
writerChoi Jeongdong 〈중앙일보〉 기자
editor Jang Jeongjin
1989년 4월 카라얀은 빈 필하모닉을 지휘해 브루크너 7번 교향곡을 녹음했다.
카라얀의 마지막 녹음이 된 이 연주는 동곡 최고의 명반으로 꼽힌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브루크너(Anton Bruckner, 1824~1896)는 사진의 시대를 산 사람이다. 그의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초상화보다 사진이 더 많이 뜬다. 사진들은 19세기 후반의 교향곡 작곡가를 과장도 미화도 없이 보여준다. 카메라 앞에 선 브루크너는 약간 긴장한 것 같다. 어색하게 미소 짓거나 입술을 꼭 다문 채 렌즈를 바라본다. 머리는 옛날 중고생 까까머리처럼 짧다. 잘생겼다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구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 같다면 어울릴까. 그런데 소박한 풍모와는 달리 그의 가슴속에는 알프스 상공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 같다. 음악을 들어보면 그렇다.
작곡가로서 브루크너의 삶은 한마디로 대기만성이다. 그도 베토벤처럼 아홉 곡의 교향곡을 남겼지만 청중에게 인정받은 것은 7번 교향곡이 처음이었다. 연주를 들은 빈Wien 시민은 15분간이나 환호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브루크너는 이미 환갑을 넘어가는 나이로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7번 교향곡의 성공에 힘입어 8번 교향곡 작곡에 착수해 3년 만에 완성했다. 역시 대성공이었다. 그는 즉시 9번 교향곡에 착수했으나 이번에는 쉽게 완성하지 못했다. 체력이 바닥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브루크너는 8번 교향곡 이후 9년이나 지난 1896년에 9번 교향곡의 3악장 아다지오까지 끝낸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후기 3대 교향곡은 더디고 힘겨운 노력을 통해 탄생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향곡들은 매우 길다. 7번은 한 시간을 넘기고, 8번은 한 시간하고도 30분을 더 연주한다. 9번 교향곡 역시 마지막 악장이 없음에도 한 시간이 걸린다. 나는 이 교향곡들을 좋아하지만 전 악장을 다 듣지 못한다. 늘 시간은 부족하고 내 손길을 기다리는 음반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각 교향곡에서 좋아하는 악장을 골라 듣는 것이다. 7번
2악장, 8번 2~3악장, 9번 2악장이 그것이다. 가려뽑은 악장을 연이어 듣는 것이 나의 ‘브루크너 교향악 축제’다.
7번 2악장 아다지오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모든 악장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 존경하는 선배 작곡가 바그너의 죽음을 예감하고 만든 장송 음악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음악을 들으면 슬픔에 빠지는 대신 여름철의 지리산 노고단이 생각난다. 운해雲海가 산 능선을 타고 천천히 넘어가는 장관. 브루크너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그렸겠지만 그의 음악은 나를 신비하고 고요한 대자연으로 이끈다.
8번 2악장 스케르초는 거친 골격을 드러내는 알프스의 바위산들과 계곡을 흘러내린 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호호탕탕 흘러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악장은 알프스 연봉連峯처럼 같은 음형을 집요하게 반복하지만 지루한 느낌 없이 매번 가슴이 툭 터지는 해방감을 선사한다. 3악장 아다지오는 빛의 향연이다. 산맥 위의 하늘, 장밋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 머리 위에서 금빛 비늘로 흩날린다. 음악이 빛이 되는 황홀경이다.
엘리 나이의 ‘월광’ 응원은 또 한 명의 여성 피아니스트를 떠올리게 한다. 나이와 같은 시대를 산 영국인 마이라 헤스(Myra Hess, 1890~1965)다.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떠날 수도 있었으나 그는 런던 도심 자신의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독일의 공습에 시달리는 시민을 위해 연주회를 열기로 했다. 전쟁이 발발한 후 모든 연주회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부의 허락을 얻어 내셔널 갤러리를 사용했다. 그림과 조각을 치운 공간에서 헤스는 매일 연주회를 이어나갔다. 기록 영상을 보면 군인이 옆에 앉아 악보를 넘겨준다. 때론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방공호로 대피하기도 했지만, 1939년 10월 10일 시작된 연주회는 런던의 암흑기를 밝히며 종전 이듬해인 1946년까지 계속됐다. 1천6백98회나 진행된 연주회에서 82만4천 명이 음악을 감상했다.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했던 독일과 영국의 두 여성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의 긴 터널을 통과했다.
9번 2악장 스케르초는 완전히 다른 음악이다. 현악기의 피치카토가 긴장을 고조시키다 폭발하듯 관현악의 총주가 터져 나온다. 멜로디니 리듬이니 할 것도 없는 파괴 본능의 발산이다. 처음 들었을 때 야생 소떼가 초원에서 지축을 울리
며 덮쳐오는 느낌을 받았다. 등골이 서늘했지만 강한 쾌감을 느꼈다. “이게 클래식이야, 데스 메탈Death Metal이야?” 하며 놀라는 사람도 있고, “브루크너 교향곡의 최고봉”이라고 감탄하는 이도 있다. 이런 음향을 19세기 시골 할아버지가 지
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흔히 브루크너 애호가들이 그의 교향악에서 오르간 음향, 더 나아가 천국과 신神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대자연의 장쾌한 이미지를 봤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지하 음악실에 틀어박혀 나들이도 하지 않고 심지어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을 들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말러는 교향곡을 열 곡 남겼는데 대부분 음반 두 장짜리 대작이다. 게다가 번스타인, 아바도, 얀손스 등 내로라하는 지휘자들이 개성 있는 녹음을 남겨놓았으니 밤낮 없이 스피커 앞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브루크 너도 마찬가지다. 그의 교향악이 펼치는 넓고 깊은 세계를 섭렵하려면 진득하게 듣고 또 들어야 한다.
지인처럼 스스로 음악 감옥에 가두지 않아도 브루크너의 모든 교향곡 전 악장을 들어야만 하는 세월이 내 앞에 다가온다. 그렇게 되면 오스트리아 노인이 긴 음악을 애써 지어놓은 걸 고마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가끔은 시간 없다는 핑계로 좋아하는 악장만 골라 듣던 시절이 그리울 수도 있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