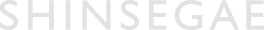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Culture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K. 563
서랍 속 편지 같은 음악
2021/12 • ISSUE 42
writerChoi Jeongdong 〈중앙일보〉 기자
editor Jang Jeongjin
기돈 크레머(바이올린), 킴 카시카시안(비올라), 요요마(첼로)가 연주한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K. 563 음반.
젊은 거장들이 생동감 넘치고 짙은 감성으로 연주한다.
젊은 거장들이 생동감 넘치고 짙은 감성으로 연주한다.
“모차르트 음악은 80%가 쓰레기다.” 인터넷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이런 주장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음악사 최고 천재의 작품 대부분이 쓰레기라니 무슨 망발인가. 그런데 의외였던 것은 다른 회원들의 태도였다. 반박하는 사람보다 모차르트 음악의 상당 부분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면 나는 모차르트 음악을 얼마나 들어보았나. 마지막 작품 레퀴엠까지 6백 곡이 넘는 작품 중 몇 곡이나 알고 있을까. 레코드 서가에서 모차르트 음반을 헤아려보니 놀랍게도 1백 장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교향곡은 41곡 중 25, 29번과 마지막 3곡 외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 27곡의 피아노협주곡도 20번 이후로만 주로 들었다. 피아노소나타는 모두 몇 곡인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현악사중주도 마찬가지. 하기야 ‘모차르트 교향곡 1번’,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3번’은 곡명도 낯설다.
바흐는 1천 곡이 넘는 작품 전체를 수록한 CD 전집을 비롯해 수백 장의 LP, CD가 서가를 채우고 있고 베토벤도 교향곡, 피아노소나타, 현악사중주, 첼로 소나타 음반이 빼곡하다. 슈베르트도 주요 가곡과 피아노곡은 거의 갖췄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음악도 아주 적은 부분만 들어봤을 뿐이고 음반 컬렉션도 빈약하다.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
연전에 타계한 고 신동헌 화백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선생은 모차르트의 모든 작품을 수록한 CD 전집을 구입해 한 장씩 듣기 시작했다. 2백 매가 넘는 전집을 독파한 뒤 모임에 나온 선생의 첫마디는 뜻밖이었다. “모차르트가 싫어질 뻔했어.” 아무리 천재라 해도 습작과 모방작, 작품성 떨어지는 초기작까지 듣는 일은 지루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선생은 모차르트 작품을 폄하하지는 않았다. 한국에도 모차르트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분들이 있고 진지하게 듣는 애호가도 많다.
음반 컬렉션이 빈약하다고 모차르트를 자주 듣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스킬과 그뤼미오가 연주한 바이올린소나타 K. 304는 들을 때마다 가슴 저리다. 슬픔이 깃든 아름다움을 저토록 우아하게 표현하다니. 누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레퀴엠에 자주 손이 간다. 죽은 이를 위한 음악이지만 내가 위안을 받는다. 피아노 환상곡의 한 소절, 관악기 협주곡 느린 악장의 한순간, 오페라의 어떤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꿈결 같은 아리아…. 모차르트가 빚어낸 보석은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디베르티멘토 K. 563은 나에게 특별한 음악이다. 서랍 속에 감춰두고 가끔 꺼내보는 편지 같다고 할까. 디베르티멘토(희유곡)는 원래 귀족의 식탁 옆에서 소화를 돕기 위해 연주하는 음악이었다. 귀족이나 교회에 고용되기를 거부했던 베토벤의 작품 목록에는 아예 없는 장르다. 그런 이유로 우습게 취급했는지 K. 563은 유명하지 않다. 모차르트 연구의 권위자 알프레트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들어본 것 중 가장 세련된 현악삼중주”라 격찬했고, 평론가들은 “칭찬의 말을 찾을 수 없다”고 놀라워했지만 대중은 잘 모르는 작품으로 남아 있다.
사실 이 곡은 밥상머리에서 연주하기엔 적당치 않다. 희유곡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작품성과 견실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감상용으로 연주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 무려 6개 악장의 대곡이기도 하다. 나는 2악장 아다지오에 특히 빠져든다. 그곳에서 체념에 빠진 모차르트를 만난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슬픈 미소를 짓고 있다.
모차르트가 이 곡을 완성한 것은 1788년, 짧은 삶을 3년 남겨둔 해였다. 그해 마지막 3대 교향곡을 완성하고 오페라 <돈 조반니>를 무대에 올렸지만 주머니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는 K. 563을 푸흐베르크에게 헌정했다. 돈을 빌려 달라고 애원할 때마다 뿌리치지 않고 도움을 준 친구다.
내가 즐겨 듣는 음반은 기돈 크레머(바이올린), 킴 카시카시안(비올라), 요요마(첼로)가 연주한 것이다. 세 거장이 1980년대 중반 젊은 시절에 녹음해 현악기들이 생동감 있고 짙은 감성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친구 S에게 이 음반 얘기를 했더니 그는 오래된 LP 한 장을 건네며 들어보라고 했다. 프랑스 삼 형제가 1백 년 전에 결성한 파스키에Pasquier 트리오가 연주한 음반이다. 고졸古拙하지만 형제가 한마음으로 빚어내는 음색이 따사롭다. 친구는 이 연주를 오래전부터 들어왔다고 한다. 나 혼자 옛 편지 꺼내보듯 은밀히 즐기는 곡인 줄 알았더니 들을 사람은 다 듣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