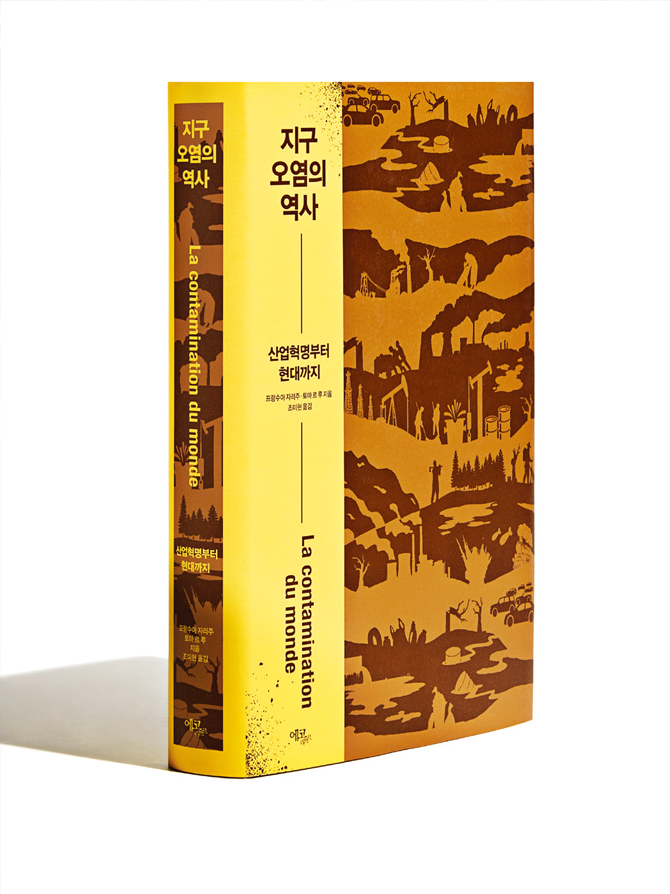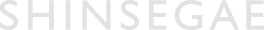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Culture
글쓰기에 ‘진심’인 책들을 소개합니다
흔한 기술이나 조언 대신 글쓰기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담은 책들을 만나보자.
글쓰기에 대하여
마거릿 애트우드 / 프시케의숲
“대부분의 사람이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 본인 머릿속에 책이 한 권 들어 있다고, 시간만 있으면 글로 풀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는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책 한 권은 품고 있거든요.”
<돌로레스 클레이본>, <미저리>, <쇼생크 탈출> 등으로 유명한 작가 스티븐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글쓰기를 일컬어 ‘끙끙거리는 힘겨운 노동’이라고 묘사한다. 뮤즈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가 우리 컴퓨터에 창작을 돕는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작가는 뮤즈가 존재하는 곳을 찾아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많은 책이 그 발품과 노력에 집중하기보다 얄팍한 기술이나 팁만 전해주는 경우가 많다. 글쓰기에 대한 진심이 담긴 책들을 통해 우리, 아니 나만의 글쓰기 방법을 찾아보자.
작가만이 누리는 행복에 대한 통찰, 〈글쓰기에 대하여〉
글쓰기에서 그 같은 경험은 “어둠을 밝히고 빛 속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오리라는 욕망 혹은 충동”을 가진 사람만의 것이다. 물론 이 욕망과 충동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작가도 일상을 살아내는 보통 사람이기에 글 쓰는 자아와 일상의 자아가 날마다 충돌하기 때문. 어떤 이의 욕망과 충동은 희미하고, 누군가의 그것은 반짝반짝 빛난다. 다만 오해는 금물이다. 글을 쓰는 자아가 일상의 자아를 이길 때만 작가로서의 욕망과 충동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글쓰기는 인간의 실존과 관련한 행위임을 애트우드는 분명히 한다. 이야기를 찾는 여정은 “어둡고도 복잡한 길”이라 말하는 애트우드는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독자들과 대화하며 글 쓰는 일이야말로 작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에둘러 표현한다. 그런 점에서 <글쓰기에 대하여>는 실제적 기술이나 방법이 아닌 작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자기만의 이야기로 풀어낸 아름다운 통찰이다.
글쓰기의 철학
에드거 앨런 포 / 시공사
“모름지기 작가가 펜을 들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단원까지가 정교하게 기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만큼 분명한 것도 없다. 지속적으로 대단원을 염두에 두고 쓸 때에만, 사건들은 물론이고 특히 사건의 모든 지점들에서의 어조가 창작 의도에 맞게 전개될 수 있다.”
글쓰기의 고전 중 고전, 〈글쓰기의 철학〉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
박미라 / 그래도봄
“글쓰기의 중요한 치유 기능을 몇 가지 꼽는다면,앞서 언급한 대로 생각을 단순화하기 위한 기록,즉 내 밖에 보관하기가 그 첫 번째이며,두 번째가 내면과의 대화다.세 번째로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만든다.”
치유하는 글쓰기의 모든 것,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
끝까지 쓰는 용기
정여울 / 김영사
“작가가 되려면 한 번쯤은 표현해야 하는 통과의례 같은 테마가 있어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내 심장이 터져버릴 듯한 아픔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슬픔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죠.”
속마음을 꺼내놓을 용기부터, 〈끝까지 쓰는 용기〉
editorLim JiminphotographerKim Myung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