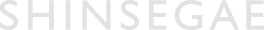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어디라도 좋다, 바깥이기만 하다면
2021/12 • ISSUE 42
공항의 매력은 그곳에 없는 장소 때문에 생겨난다. 공항은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언젠가 닿기를 열망하는 장소, 즉 아직 이곳에 없는 장소들의 허브다.
writerJang Eunsu 출판 편집인, 문학평론가 editorJang Jeongjin
"장소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의미 깊은 중심이다.
장소를 잃은 인간은 의미도 함께 상실한다."
여행은 세계 곳곳을 나의 장소로 바꾸는 일이다
여행이란 무엇인가. 세계 곳곳의 낯선 공간을 나의 장소로 바꾸어가는 일이다. 떠나기 전에 지도나 사진 속 이미지에 불과했던 곳이 돌아온 후에는 언제든 나만의 색깔을 입혀 떠올릴 수 있는 장소로 바뀐다. “내가 여기에 있다.” 4만 년 전, 인류는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린 후, 입으로 물감을 뿜어서 짙은 손바닥 자국을 남겼다. 시간이 자신의 존재를 훔치지 못하도록, 죽음이 자기를 망각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장소로 바꾸려는 본능은 우리 안에서 이처럼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내가 거기 있기 전에 세계는 낯설고 무섭고 무의미하다. 두루 발로 걸어 흔적을 남기고 손으로 서명을 새겨 넣음으로써 인간은 세계를 익숙하고 친밀하며 의미 있게 변화시킨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공간이 나의 ‘무엇’이고, 내가 공간의 ‘무엇’일 때, 비로소 장소가 탄생한다.
어떤 곳이 나에게 장소인지 확인하는 법은 간단하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런던의 거리에서,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나는 무엇이었는가에 선뜻 답할 수 있을 때 그곳은 나의 장소가 된다.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구글에 얼마든지 있다. ‘연인과 젤라토를 먹으며 검투사들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 ‘길을 잃고 헤매다 빅 벤의 종소리를 들었던 곳’, ‘꽃이 가득한 정원을 우산도 없이 걸었던 곳’ 등이 공간을 장소로 바꾼다. 캐나다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에 따르면, 장소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의미 깊은 중심이다. 장소를 잃은 인간은 의미도 함께 상실한다.
공항은 비장소, 통과하기 위해 있는 곳이다
좋은 공항은 사람을 절대 머무르게 하지 않는 곳이다. 빠르게 움직여 매끄럽게 통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성스러워서, 너무나 흥미로워서 인간 영혼을 빨아들이는 장소가 공항에는 있을 수 없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없이 머물고픈 곳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항공사의 재앙이다. 수많은 승객이 아예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테니까. 공항에서 인간의 주의를 홀리고 자제력을 무너뜨릴 만큼 매력적인 곳은 애초에 허가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는 공항을 ‘비장소’라고 부른다.
잘 꾸민 몇몇 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댄 후 ‘머물고 싶은 공항’을 운운하는 이들은 어리석다. 그들은 공항의 원리를 모른다. 그런 공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객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 샤를 드골 공항 관계자의 말이 차라리 공항의 정체를 잘 드러낸다. 아무리 멋져도 공항은 지붕 달린 통로에 불과하다. 공항은 통과하려고, 그것도 빨리 통과하려고 만든 곳이다. 가장 훌륭한 공항은 들어서자마자 곧장 떠날 수 있는 곳이다. 공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공항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유리처럼 투명한 곳이다. 비행기가 연착해 탑승구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출발 시간은 다가오는데 검색대 직원이 농담을 주고받을 때, 연계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부친 짐이 나오지 않을 때를 떠올려보면 안다. 공항은 빠르게 통과해서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한시라도 바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공항은 ‘장소 없는 공간’이다.
공항에서 우리는 일상이라는 악에서 벗어난다
공항의 매력은 그곳에 없는 장소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언젠가 닿기를 열망하는 장소 말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 장소를 유토피아라고 한다. 공항 터미널은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장하는 유토피아들의 허브다. 줄지어 늘어선 비행기들은 그 가능성을 우리 눈앞에 현현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용기를 불러일으킨 후 약간의 비용을 치르면 하루도 안 되어 우리 몸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일찍이 보들레르가 꿈꾼 “그 어디라도 좋다, 이 세상 바깥이기만 하다면”이 곧바로 우리 삶이 된다. 더럽고 타락한 이 도시, ‘악의 꽃’의 온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악의 정체를 착각한다. 악이 범죄와 연관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범죄는 악의 일부일 뿐, 악 자체는 아니다. 악의 참모습은 ‘무의미’다.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말한다. “지나간 것과 전혀 없다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느새 악에 빠져든 것이다. 악마의 정의는 무無를 사랑하는 자다. 그는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무한히 이어지다 어느 날 덜컥 죽음이 찾아오면, 그리하여 허무를 느끼고 전율한다면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신이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무의 달콤한 유혹을 무찌르고 미지의 모험에 몸을 던져 끝없는 창조에 나서는 사람뿐이다. 천사는 말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있으려 하는 일, 일상이 아니라 비일상을 일으키려 애쓰는 일, 무심한 세계를 장소로 바꾸어가는 일, 그러니까 여행은 인간을 구원하는 작은 습관이다. 공항은 우리가 일상이라는 악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곳이다. 멀리서 공항을 오르내리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남은 공항을 다정한 장소로 만든다
사람들은 즐겁게, 슬프게, 기껍게 성내며 끝없이 서로를 지나친다. 기대에 찬 표정도 있고, 근심 가득한 표정도 있다. 알아듣는 언어보다 못 알아듣는 말이 더 많은데도 사람들은 용케 결투를 벌이지 않고 통로를 빠져나간다. 그러나 사람들 각각은 이 세상 어딘가의 장소를 품고 있다. 그들은 ‘우연한 바깥’이고 ‘또 다른 삶’으로서 곁에 있다. 대화는 그 삶을 내 안에 옮겨붙게 한다.
새벽에 홀로 태국 공항에 내렸을 때가 생각난다. 텅 빈 통로와 상점가를 이리저리 걷다가 레스토랑 한 곳에 자리 잡았다. 옆자리 신사가 툭, 하고 말을 건넸다. 그도 나도 심심하고 외로웠다. 독일에서 온 사람이었다. 간단한 안주를 놓고 잔을 부딪치면서 영어로 더듬더듬, 두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닥치는 대로 화제를 찾았다. 헤르만 헤세에서 스티븐 킹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자금성까지 시간을 즐겁게 때울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좋았다. 덕분에 방콕 공항은 나에게 ‘새벽, 독일 신사, 맥주, 수다’의 장소로 변했다. 인간은 의외로 쉽게 하나임을 확인하고,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면 아무리 삭막한 비장소도 다정한 장소로 변한다. 그러고 보면 입국장이야말로 공항의 유일한 장소일 수 있다. 연인이, 친구가, 동료가, 부모가, 아이가, 고단한 여행자를 기다리는, 공항에서 가장 인간적인 공간 말이다. 아, 여행 가고 싶다.
"공항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나라로 떠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준다."
©briana tozour-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