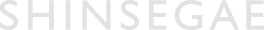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머리 위로 새 하늘이 열린다
어느 하루를 골라 한 해의 ‘첫날’을 선언함으로써 물리적 시간에 인간적 문턱을 마련한다. 묵은 삶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개벽하는 일에 대하여.
새로운 삶은 본래 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히브리어로 ‘거듭나다’를 아나겐나오anagennao라고 한다. 아나(ana-)는 ‘위로부터’란 뜻이고, 겐나오gennao는 ‘태어나다’란 뜻이다. ‘거듭나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힘을 맞아들여 인생 서사를 고쳐 쓰는 일이다. 범속하고 무의미한 삶을 버리고, 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는 일이다.
동양에서도 다르지 않다. ‘새로움’을 뜻하는 한자 신新은 ‘도끼(斤)로 갓 잘라낸 나무(木)’를 글자로 표현한 것이다. 일본의 문자 학자 시라카와 시즈카에 따르면, 글자 왼쪽에 있는 친 은 나무에 신의 바늘을 꽂아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다. 새로움은 사람이나 사물이 신의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 신성한 바늘로 찔러 나무에 스민 사악한 것을 정화한 다음, 도끼로 잘라내 다시는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정화 과정을 거치면 일상의 나무는 신성한 나무로, 평범한 인간은 신성한 인간으로 탈바꿈한다. 신의 힘으로 정화한 나무인 신新은 아무 데나 쓰지 않고 제사 같은 신성한 일에만 사용했다.
새로운 삶 역시 마찬가지다. 신성한 힘을 받아들여 묵은 삶에서 삿된 것을 모두 쫓아낸 다음, 도끼로 낡은 습관을 잘라내 전혀 다른 시간이 열릴 때 새로운 인생은 시작된다.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리 없다. 당연히 신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날을 골라야 마땅하다.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날을 선택해 목욕재계 등 먼저 자신의 몸을 정화하고, 신新에 불을 붙여 낡은 자아를 불사른 후, 마음과 영혼을 다해야 새로운 삶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한 해 3백65일은 물리적으로 모두 똑같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 24시간이 무한히 반복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 시간을 엄숙히 멈춰 세운 후 어느 하루를 골라서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한 해의 ‘첫날’을 시작한다. 흐르는 물에는 발을 두 번 담그지 못하고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으나, 평탄하고 기계적인 시간의 흐름을 끊어내 첫날을 다시 살 수 있는 것처럼 선포함으로써 물리적 시간에 인간적 문턱을 마련한다. 낡은 해를 갈아엎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묵은 삶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개벽하는 일에 대하여.
새해 첫날을 한자로 원단元旦이라 한다. 갑골문에서 원元은 사람(人) 위에 이二가 올라앉은 모양이다. 이때의 이二는 머리 또는 위를 뜻한다. 인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이므로 원元은 ‘으뜸’이란 뜻이면서, 동시에 사람 위로 하늘이 열리는 ‘태초, 처음’을 표상하게 되었다. 단旦은 태양(日)을 땅 또는 구름을 뜻하는 네모(口)가 받치는 모양으로, ‘해 뜰 무렵’을 뜻한다. 따라서 새해란 날들의 으뜸으로서 인간의 머리 위로 하늘이 처음 열리는 날이다. 원단은 위로부터 오는 창조의 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날이 열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새해 아침이면 우리는 흔히 새벽 첫 빛을 만끽할 만한 신성한 장소를 찾는다. 뱀이 피부가 벗어지는 고통 끝에 새로운 몸을 얻듯, 우리 역시 거센 겨울 추위를 힘겹게 견디면서 태양의 힘으로 낡은 삶을 불태우는 감격을 누리고, 삶의 축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열어젖히려는 것이다.신이 보낸 불의 공은 우리의 오래된 자아를 불사른다.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거운 굴레를 불태우고, 영혼의 숨통을 틔워주며, 마음에 황홀한 열정을 불어넣는다. 이탈리아 작가 가브리엘레 단눈치오는 바다 위 어둠 속에 떠오른 “거대한 공”을 “영광의 기적”이라 불렀다. 불의 공은 우리 안에 “힘과 자유와 초인적 느낌”을 불어넣고, “바람이 돛을 부풀리듯 우리 심장을 타오르게 한다”고 이야기했다. 신의 불꽃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병든 자아를 제거하고 정열의 박동을 되돌려받는다.
살아 있는 시체인 좀비는 우리 시대에 가장 흔한 자아 상태를 암시한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시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세웠던 굳센 결심이 어느새 흔적조차 없다. 돌아보면 한 해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노예 같은 비겁함만이 영혼을 부여잡고 있을 뿐이다. 어렵고 고된 날들을 죽을 둥 살 둥 버티다 보면 문득 하루하루 죽음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경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녕 삶이란 말인가!’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횔덜린에 따르면 사랑을 잃은 삶, 정열을 박탈당한 일상은 “서서히 꺼져가는 죽음”이나 다름없다. 어제 같은 하루가 오늘 또 되풀이되고, 황폐하고 무의미한 관계가 되풀이될 때 우리 영혼은 보람 없는 피로에 질식해버린다. 두근거리는 기쁨도, 넘치는 활력도 없는 삶은 불안이 증식하는 온상이요, 죽음이 횡행하는 통로가 된다.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에서 횔덜린은 생기 없는 인생을 살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를 불의 능력으로 정화해서 재생한다.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의 삶이 “추위가 붙들어 잡아놓은 강물” 같다고, “성스러운 생명의 정령이 잠들고 멈추어 있는” 감옥 같다고 느낀다.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 불은 청춘의 아름다운 시간과 위대한 사건을 되돌려주는 원천이 된다.
새해 첫날 우리가 이글대는 태양 빛으로 자아를 온통 물들이듯, 엠페도클레스는 에트나 화산에 몸을 던져 신의 불꽃과 자기 영혼을 하나로 만든다. 생명이 약동하고 기쁨이 출렁대는 것을 만끽하면서 엠페도클레스는 힘차게 노래한다. “내 가슴에서 물결치는 것이 있으니/ 시간이 내게 쌓아놓은 것은 메아리치며 무너지네./ 무거운 것들은 떨어지고또 떨어지며, 내 위에서는/ 맑고 가벼운 생명이 환하게 피어나네.” 우주의 불은 세월이 우리 삶에 덕지덕지 쌓아놓은 삿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에 맑고 가벼운 생명의 율동을 돌려준다. 마찬가지로 새해 첫 빛을, 신이 보낸 불의 공을 내면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고 위대하며 풍요로운 인생을 돌려받는다. 좋은 삶에는 문턱이 필요하다. 낡음을 떠나보내고 새로움을 맞이해야 인생은 건강해진다. 피로에 오염된 삶에서 벗어나 거듭날 때, 우리가 “주변에 생명을 펼치면서 그것을 북돋고 쾌활하게” 할 수 있다고 횔덜린은 이야기한다. 한 사람의 새로운 인생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빛의 힘을 퍼뜨린다. “높은 의미로 가득”하고 “강렬한 동경이 솟구쳐 오르는” 삶이, 찬란한 언어와 위대한 업적으로 가득하며 자기 손으로 삿된 세계를 혁신할 수 있는 삶이 온 누리에 펼쳐지는 것이다.
새해 첫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여는 혁신을 고민하고, 묵은 시간을 태초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개벽을 실행한다.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칠지라도 새해를 새해답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꼭 필요하다. 삶의 의미를 따지고 고민하는 거룩한 시간 없이 인간은 좀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돌아보고 살피면서 지나간 삶에서 묻어온 붉은 먼지를 떨어내고, 공손하고 경건하게 희망의 경로를 살펴야 비로소 진부한 삶을 놀라운 삶으로 바꿀 가능성이 생겨난다.
짧은 순간이라도 지난 일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다른 삶을 고민하는 데 정성을 기울일 때만 인생은 약간이나마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한다. 정성의 정精은 ‘고르다’, 성誠은 ‘진실하다’라는 뜻이다. 어지러운 것은 골라내서 덜어내고, 어리석은 것은 무찔러서 제거하며, 사악한 것은 솎아내서 거름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만드는 일이다. 정성 어린 관심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writerJang Eunsu 출판 편집인, 문학평론가
editorKim Minhyung
©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