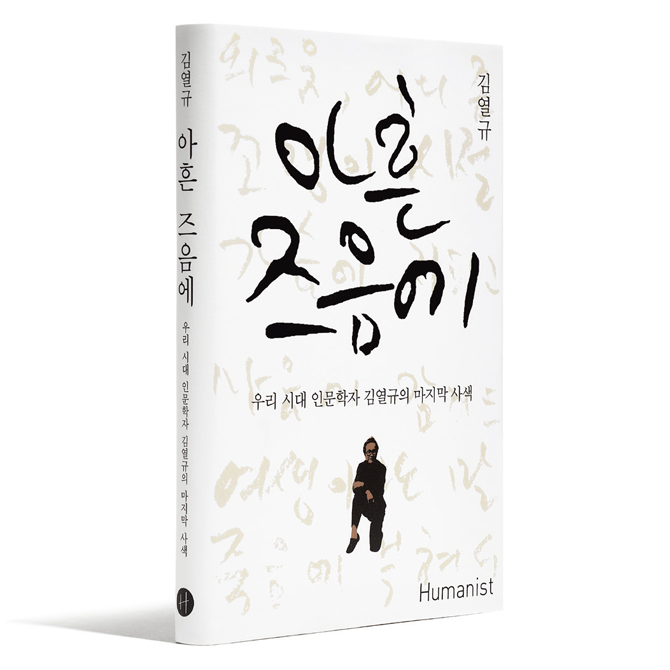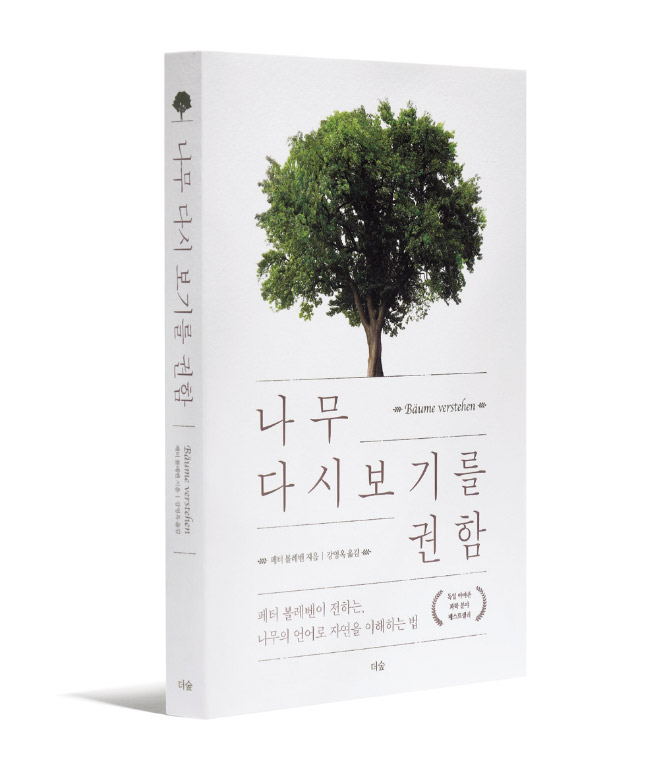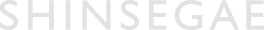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비발디 〈사계〉
이탈리아의 春夏秋冬
2020/1 • ISSUE21
writerChoi Jeongdong 〈중앙일보〉 기자
이탈리아의 이무지치합주단이 1959년 발표한 음반. 펠릭스 아요가 솔로 바이올린을 맡았다.
이후에 나온 모든 〈사계〉 음반의 전범이 되었다.
비발디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하루를 머문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나절이다. 그 신비하고 매혹적인 도시를 스치듯 방문한 것은 숙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여행 중 베네치아행이 갑자기 결정돼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북상하며 전화로 숙소를 수소문했는데, 결국 빈방은 없었다.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 중 하나다. 그날 밤은 파도바에 머물렀다.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강의한 대학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을 거닐며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다음 날, 완행열차를 타고 베네치아로 향하면서 전화위복의 기쁨을 맛보았다. 파도바에서 베네치아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평야였다. 포플러가 늘어선 길가에 추수를 마친 들판이 펼쳐졌고 멀리 마을과 목장이 그림 같았다. 내가 탄 열차는 그 평원을 천천히 굴러갔는데, 나는 이곳이 〈사계四季〉의 무대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비발디의 사계는 봄·여름·가을·겨울 풍경을 그렸다. 아마도 비발디가 직접 썼을 소네트(sonnet, 짧은 정형시)를 음악으로 옮긴 것이다. 새들이 노래로 인사하고 시냇물이 살랑이는 봄,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활기를 잃고 나른해지지만 천둥과 번개,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는 여름,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거나하게 마시고 달콤한 낮잠에 빠져 드는 가을, 들판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난롯가에서 한가한 나날을 보내는 겨울. 이런 정경이 네 개의 협주곡에 연이어 펼쳐진다.
그런데 베네치아에는 이런 자연이 없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이 도시는 로마제국 말기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훈족의 말발 굽을 피해 이탈리아 북동 지역 사람들이 갯벌로 피신해 들어가 세웠다. 갯벌에 말뚝을 촘촘히 박고 그 위에 석재를 쌓아 올려 단단한 평지를 만든 다음 건설한 도시다. 1백 50개의 섬이 4백10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운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런 곳에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줄 대자연이 있을 리 없다. 나무라고는 좁은 공간에 비집고 들어선 몇 그루뿐이다. 비발디는 당시 베네치아공화국 영역이었던 파도바 등 육지를 여행하며 체험한 계절을 음악으로 읊었을 것이다.
산타루치아 역에서 열차를 내려 수상 버스를 타고 Z형 대운하를 천천히 통과하니 산마르코 광장 선착장이었다. 그곳은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인파에 떠밀려 광장으로 향하는데 바로 뒤에서 모국어가 들려왔다. “빨리 안 오고 머하노!” 물론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너무도 정겨운 그 외침은 아무도 날 아는 이 없는 곳에 왔다는 환상을 깨기에 충분했다.
베네치아 태생의 비발디는 ‘서양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열심히 모방한 천재였다. 바흐의 협주곡 중 남국의 밝은 기운의 곡은 거의 비발디 원작이다. 그러니 바흐를 떠받들면서 비발디를 우습게 아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며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18세기 유럽의 발달된 출판업 덕분에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다.
알려진 대로 비발디는 천식 환자였다. 태어날 때 곧 죽을 것 같아서 산파가 서둘러 세례를 주었다고 하니 타고난 약골이었던 모양이다. 가톨릭 사제가 되었지만 기침 때문에 미사를 집전하지 못해 병원 부설 고아원 음악 선생으로 평생의 대부분을 살았다. 비발디의 악기가 된 고아 소녀들은 기악과 성악이 뛰어나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18세기의 베네치아는 유럽 엘리트들이 지적 체험을 하기 위해 빠트리지 않고 들르는 곳이었다. 그들에게 비발디가 가르치는 고아원 소녀들의 연주회는 진기한 볼거리였다. 비발디의 음악이 관광 상품이었다는 말이다. 혹시 이 사실이 비발디 음악의 특징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었을까. 흔히 비발디는 수백 곡의 같은 곡을 썼다느니, 6백 번 의 편곡을 했느니 비판을 받는다. 곡이 비슷 비슷하기 때문이다. 비발디는 매번 바뀌는 청중, 즉 관광객을 위해 굳이 다른 분위기의 곡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게 아닐까. 반면 바흐의 청중은 라이프치히 시민으로 늘 같은 사람들이었다. 바흐도 기악곡을 쓸 때 자신의 곡을 재활용하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매주 연주한 칸타타는 비슷한 곡이 없다.
〈사계〉는 계절의 흐름을 실감할 때 새삼스레 음반을 뽑아 들게 된다. 창밖에 눈이 내리면 겨울 2악장에 바늘을 내린다. 엇비슷한 비발디의 협주곡 중에서 〈사계〉는 감각적 선율로 가득 찬 보석이다. 식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흔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소네트를 따라 읽으며 귀 기울여 들으면 북부 이탈리아의 춘하추동春夏秋冬이 우리랑 같아 비발디가 친구처럼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