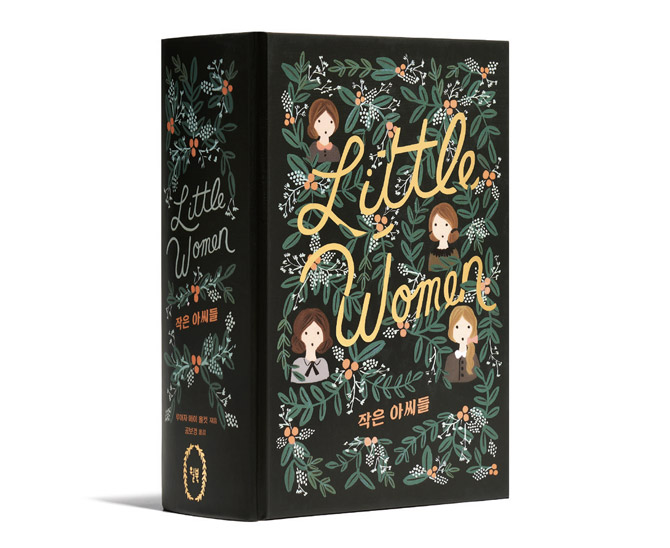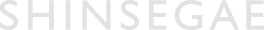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낯선 도시의 골목을 천천히 거닐면
2020/2 • ISSUE 22
writerJang Eunsu 출판편집인, 문학평론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지도를 손에 들고 스스로를 안내해야 한다.
내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내발로 검증하면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쌓인다.”
여행지에서 숙소를 찾아 짐을 부리고 나면, 일단 주변을 둘러보려고 무작정 걷는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둘러보면서 지도를 머릿속에 만들어간다. 오래된 도시일수록 골목은 다른 골목으로 이어져 끝이 없다. 바깥에서 보면 막다른 듯한데 길모퉁이를 돌면 너른 길로 열리기도 하고,뻥 뚫린 것 같은 길도 갑자기 끊어지면서 저택에 가로막힌다. 터덜터덜 돌아 나오다 보면 샛길이 있고, 문득 들어서서 걷다 보면 숙소 옆 골목까지 쭉 이어지기도 한다.
여행지에서 한번 지나친 골목을 다시 걷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차라리 일부러 길을 잃는 쪽을 택해야한다. 전혀 엉뚱한 길이 아니라면, 아침마다 지나는 길을 달리하고 저녁마다 돌아오는 길을 바꾸면서 걷는 편이 낫다. 한 갈래 골목마다 하나의 세계다.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르다. 어느 공간이든 인간과 함께 진화한다. 골목안 사람들의 삶이 남긴 자취를 어떤 식으로든 담아낸다.골목들이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파리나 런던에서는 좋아하는 소설의 배경으로 쓰인 장소나 건물을 마주치는 등 뜻밖의 횡재를 한 적도 있다.이런 건 여행 안내서에 없다. 최근에 발표된 소설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장소를 걷다 보면 이상한 기시감이 들곤 한다. 그러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표지판을 보고 갑자기 깨닫는 것이다. ‘여기가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걸었던 거리로구나.’ ‘어라, 괴테의 집이네.’
일없이 골목마다 내키는 대로 기웃거려도, 유서 깊은 동네에서는 아무도 길을 잃지 않는다. 바둑판처럼 길이 반듯하고 찍어낸 듯 집 모양이 엇비슷한 동네에서나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늘어선 신도시에 처음 이사했을 때, 한밤중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어 몇 블록이나 거리를 헤맸던 악몽이 떠오른다.〈참 괜찮은 눈이 온다〉에서 소설가 한지혜 역시 비슷한 경험을 토로한다. “이상한 일이다. 미로 같은 골목에서 길 한번 잃지 않고 살았던 나는 넓은 길에서 오히려 막막하다.” 그렇다. 인간은 “너무 좁아 담벼락이 어깨를 스치는” 골목이 아니라 심신의 한계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야 하는 탁 트인 8차선 도로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 자신이 붙은 다음에는 아예 지도를 버리는 편이 낫다. 발길 닿는 대로 길을 이어가고 눈썰미로 구분하는 것이다. 눈길 끄는 것으로 골목 하나하나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면 된다. 파스타 길, 슈퍼 길, 소품 예쁜 의상실 길, 파랑 대문 길, 프리지어 화분길…. 때때로 막다른 골목이 나오고, 얼기설기 복잡해 보여도, 골목은 몸을 늘 다른 골목으로 옮겨준다. 주변을 살피면서, 천천히, 슬금슬금, 멀리까지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을 드나들 때마다 반복한다. 여행지를 떠날 때쯤이면 어느 순간 동네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행이다.
“한 갈래 골목마다 하나의 세계다.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르다.
어느 공간이든 인간과 함께 진화한다. 골목 안 사람들의 삶이 남긴 자취를 어떤 식으로든 담아낸다.”
아마도 휴먼 스케일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 감각에 맞추어 세계를 인식한다. 지나치게 작으면 답답하고 너무 거대하면 무섭다. 양쪽 모두에서 인간은 소외감과 불안을 느낀다. 미하스의 골목은 두세 사람이 나란히 서면 어깨가 닿을 정도다. 이런 골목은 인간을 괴롭히지 않고, 평화롭게 만든다. 아무 벽에나 털썩 기대어앉아서 쉴 수 있는 이유다. 풍경이 거대하면 장엄하고, 작으면 귀엽고, 적당하면 아름답다. 미하스 마을이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이곳을 아름답다고 기억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