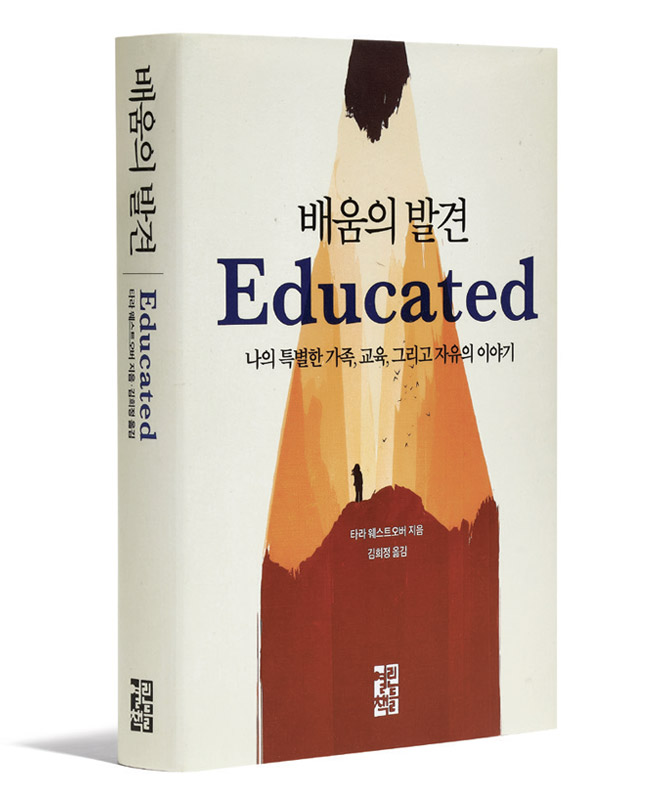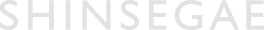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2020/4 • ISSUE 24
Jungjin Lee, ‘Voice 28’, 2019, Archival Pigment Print, 152.5×213.3cm.
Courtesy of the artist & PKM Gallery
editorKim JihyewriterPark Jisoo 〈보스토크 매거진〉 편집장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
목탄으로 꾹꾹 눌러 그린 듯 언덕은 검고 쓰다. 그 언덕을 따라 굽은 길에 반짝이는 햇빛은 무심한 듯 하얗고 달다. 나무 한 그루 없이 거친 돌만 나뒹구는 곳에서 인적을 찾는 건 소용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아직까지 이 언덕길을 지나간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황량하기 그지없다. 마치 최초의 길을 보여주는 듯한 풍경에는, 보는 이를 최초의 순례자로 초대하는 듯한 장면에는 한없이 고요한 침묵만이 머문다.
이 사진은 수묵화 같은 농담과 독특한 질감을 지닌 한지 프린트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이정진이 촬영한 것이다. 그는 다양한 국적의 사진작가 12명과 함께한 프로젝트 ‘This Place’에 참여해 이 사진을 찍었다. 2012년에 진행된 이 공동 프로젝트에는 제프월Je! Wall, 토마스 스트루트Thomas Struth, 스테판 쇼어Stephen Shore, 요제프 코우델카Josef Koudelka, 질 페레스Gilles Peress, 로잘린드 솔로몬Rosalind Solomon 등 현대 사진사에 자신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긴 거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종교와 민족문제로 첨예한 갈등과 시련을 겪어온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대인의 삶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2014년부터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통해 공개되었다. 아시아 출신 작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이정진은 자신만의 고유한 시선과 방식으로 이스라엘 풍경과 마주했다. 그 결과물은 ‘Unnamed Road’(2010~2012)라는 제목으로 묶어 선보였고, 동명의 사진집도 출간했다.
이 연작 중 한 장면인 언덕길 풍경은 영화의 타이틀 샷처럼 작업 전체에 흐르는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해준다. 이름 없는 길, 바꿔 말하면 ‘차마 이름 붙일 수 없는 풍경’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이는 굴곡의 역사가 깃든 이스라엘의 황량한 현실을 비유하는 동시에 그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느낌을 투영한 표현으로 읽힌다. “나는 내 카메라 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 사물 또는 풍경을 통해 내가 느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언젠가 했던 작가의 말을 떠올려보면 그가 담아낸 풍경이란 결국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그 세상에 반응했던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저 사진 속 실제 장소에 간다고 해서, 저 언덕길 앞에 서 있는다고 해서 그 풍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사진을 천천히 면밀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닿는 곳은 이스라엘의 외딴 언덕길이 아니라, 섣불리 풍경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단단한 마음일 것이다.
Jungjin Lee, ‘Voice 39’, 2019, Archival Pigment Print, 108.5×153cm.
Courtesy of the artist & PKM Gallery
섣불리 이름을 붙이지 않는 마음
그렇다면, 섣불리 풍경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마음은 무엇인가, 또 반대로 풍경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풍경이든, 사물이든 이름을 붙이는 일은 무언가를 알아가는 지각 과정의 산물이다. 그 풍경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물이 어떤 용도인지 알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에 걸맞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건 풍경이든 사물이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각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요한 감각 중 하나인 시각은 그 이름과 의미를 알기 전까지 가장 활발하다. 말하자면,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알기 위해 면밀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된다.
예를 들어, 사전 지식이 없는 아이일수록 무언가를 가까이에서 아주 오래 관찰한다. 개미라는 이름을 모르는 아이가, 강아지가 문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가 땅에 엎드려 개미를 바라보고, 강아지 코앞까지 눈을 들이민다. 그렇게 아이들은 각각의 이름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온몸으로 바라본다. 이와 달리 이름과 의미를 잘 아는 어른들은 더 이상 개미와 강아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게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순수한 방식의 바라보기를 멈춘다.
Jungjin Lee, ‘Opening 10’, 2016, Archival Pigment Print on Korean Mulberry paper, 145.5×76.5cm.
Courtesy of the artist & PKM Gallery
제자리를 바라보는 눈의 의지
그런데 사진작가는 평생 바라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한 장의 사진을 얻는 과정은 아이가 세상을 온몸으로 바라보는 일과 닮았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미 알고 있는 이름과 의미,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예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사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여겨지지만, 자신의 예민한 눈에 의지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진작가들은 사진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을 전하지 않는다. 의자와 가위, 숟가락 등 현실에서 평범한 이름과 의미를 지닌 사물을 담아낸 이정진의 연작 ‘Thing’(2003~2006)이 때로 섬뜩할 정도로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물건을) 손에 넣으면 방에 한동안 그대로 둔다. 사진을 정말 찍고 싶을 때까지 몇 달이 걸릴 때도 있다. 뭔가를 처음 볼 때는 재료와 모양 같은 것에 매료되곤 한다. 그런데 이 연작의 경우 그런 아름다움이 모두 잦아들 때까지, 그 안에서 뭔가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 사물이 그 자체의 영혼을 갖게 될 때까지.” 작가의 말에서 기다림이란 결국, 사물에 덧씌워진 진부한 이름과 뻔한 의미가 모두 벗겨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아닐까. 또 그 시간이란 외부에서 부여한 모든 이름과 의미가 덧씌워지기 이전, 사물이 자신으로 탄생했던 최초로 돌아오는 순간은 아닐까. 평소 알고 있던 이름이나 의미가 한없이 무색해지는 ‘Thing’을 바라보면서 어느 노래의 노랫말을 떠올린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정진의 사진이 아름답다면, 그건 단순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서도, 한지 프린트의 단아한 매력을 잘 표현해서도 아닐 것이다. 모든 존재의 제자리를 바라보려는 눈의 의지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 의지는 억지로 붙인 이름과 의미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로버트 프랭크가 이정진의 사진을 두고 말했던 “인간의 야만성이 배제된 풍경” 또한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