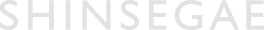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모차르트 변주곡 K.360
청중의 음악 수준
2020/5 • ISSUE 25
writerChoi Jeongdong <중앙일보> 기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1791)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알프스 자락에 위치한 이 도시는 당시 인구 1만 6천명으로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재능 있는 음악가이던 아버지 레오폴드는 잘츠부르크 대주교의 궁정 음악가였다. 신동으로 소문난 아들 볼프강도 17세에 대주교의 궁정에 들어가 직업 음악가의 길을 걸었다. 아버지 레오폴드는 모차르트가 어릴때부터 온 유럽을 데리고 다녔다. 한번 떠나면 짧게는 수 주일, 길게는 몇 년간 계속된 여행은 선진 음악 교육인 동시에 취직 자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잘츠부르크는 나름의 음악 전통이 있었으나 빈이나 파리, 런던, 밀라노와 비교하면 시골이었다.
1772년, 대주교가 바뀌면서 모차르트 부자는 불편해진다. 전임 지기스문트 대주교는 부자의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너그러이 보장했다. 그러나 신임 히에로니무스는 달랐다. 음악 자체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부자의 여행을 싫어했다. 모차르트의 세 번째 뮌헨 방문을 계기로 양측은 크게 충돌했다. 1780년 말 모차르트는 바이에른 선제후에게 의뢰받은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 뮌헨을 방문했다. 대주교는 여행 중인 모차르트를 소환했다. 당시 대주교는 빈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빈으로 갔고, 둘은 대판 싸우게 된다. 영화 〈아마데우스〉(1984)는 둘의 결별을 코믹하게 그렸다. 자신이 지휘한 관악 세레나데 ‘그랑 파르티타’를 듣고 감동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척하며 모차르트는 대주교 면전에서 엉덩이를 치켜든다. 분노한 대주교는 지팡이를 내려치고, 둘은 완전히 갈라선다.
모차르트는 빈에 정착한다. 대주교가 지긋지긋하고 잘츠부르크의 보수적인 음악풍토도 싫었다.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거듭 편지를 보내왔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답장에 이렇게 썼다. ‘빈은 제가 일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궁정이나 교회의 월급을 받지 않아도 연주가, 작곡가, 교사로 일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 시기의 모차르트가 쓴 작품 하나를 우연히 듣게 됐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6개의 변주곡 K. 360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아르튀르 그뤼미오가 피아니스트 발터클린과 연주한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LP를 듣고 있었는데, 소나타 K. 454가 끝나고 이어진 곡이 K. 360이었다. ‘아, 저건 뭐지? 저런 곡도 있었나?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 친숙한 멜로디, 살짝 슬픈 g단조 선율이 마음에 착 감겼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파리를 여행할 때 알게 된 샹송을 변주곡으로 만든 것이다. 제목이 오랫동안 ‘아아, 나는 사랑을 잃었네(Hélas, j’ai perdu mon amant)’로 알려져 왔으나 그것은 모차르트가 잘못 알았던 것이고, 바른 제목은 ‘샘물가에서(Au bordd’une fontaine)’라고 밝혀졌다. 이 노래는 16세기부터 프랑스에서 불렸다고 한다.
허허벌판에 홀로 선 25세의 프리랜스 음악가 모차르트가 변주곡을 만든 것은 생계를 위해서였다. 18세기 말 빈에서는 변주곡이 유행했다. 레슨 제자를 구하고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술적 수준을 허물지 않으면서 대중의 취향도 고려해야했다. 다행히 변주곡 ‘샘물가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모차르트가 한번 듣고 기억하고, 21세기의 나도 듣자마자 고개를 번쩍 든 멜로디 아닌가. 주제에 애상哀傷이 스며 있고 변주를 듣다 보면 위안을 얻는다.
이 변주곡은 당시 빈 시민의 음악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좋은 음악이긴 해도 짧고 쉬운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한다. 음치라도 한번 들으면 선율을 흥얼거릴 수 있다. 그들이 변주곡을 좋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모차르트의 K. 360으로부터 45년 뒤같은 도시에서 베토벤이 현악사중주 13번 Op. 130을 발표한다. 초연 무대에서 짧은 2개 악장이 앙코르로 연주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작곡가는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왜 푸가를 앙코르로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 우둔한 소 떼들! 아니 당나귀들!”
너무나 혁신적이라 Op. 133으로 독립해야 했던 베토벤의 ‘대 푸가’는 아직까지도 청중에겐 어렵다. 예나 지금이나 청중의 수준은 작곡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선지 만년의 모차르트, 베토벤은 청중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멀리 앞서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