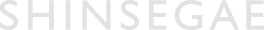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카르슈텐 휠러
경험의 딜레마
2020/5 • ISSUE 25
writer Young-jun Tak 작가
"관객은 이미 출발점과 도착점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 두 지점 사이를 잇는 찰나의 과정 속에서
마치 ‘자신을 잃는(losing yourself)’ 듯한 기분을 만끽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3월 말 전 세계의 상황을 보고 있자면, 벨기에 출생 독일 작가 카르슈텐 횔러Carsten H!ller의 작품에 관해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를,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여러 작품, 전시는 물론 아트 페어까지 평평한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 새 삶을 찾는다고 해도 횔러의 작품은 가상 세계에서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육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과학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곤충 학자이던 횔러는 1990년대 초반 과학계를 떠나 지금까지 미술계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그 실험에 관객이 초대됐을 뿐이다.
그의 작품 혹은 전시를 접하면 작은 당혹감에 머뭇거리게 된다. 전시장에는 미끄럼틀, 회전목마나 폐쇄 미로 같은 놀이 기구, 침대 등 우리가 익히 아는 물체 혹은 ‘Light Corridor’(2016), ‘Y’(2003), ‘Flying Machine’(1996) 등 작가가 개발한 무언가가 놓여 있다. 어쨌든 관객은 한눈에 작동 체계를 파악하고 ‘예견’할 수 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타본 미끄럼틀이 미술 전시장에 있을 뿐이고, 거울처럼 대상을 반사하는 표면으로 뒤덮인 회전목마는 지극히 느리게 움직일 뿐이며, 우리가 매일 밤 드러눕는 사적인 침대가 확 트인 미술관에 덩그러니 설치돼 있을 뿐이다. 미리 온 관객들은 횔러의 작품을 체험하고 있다. 그 앞에서 다른 관객은 망설인다. ‘내가 굳이 이 뻔한 걸 경험해봐야 할까?’ 횔러의 작품은 오만할 수도 있는 그 ‘예견 가능성(predictability)’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견 불가한 경험의 찰나
횔러의 트레이드마크로 매끄러운 은빛이 감도는 금속관 소용돌이 미끄럼틀 작품을 들 수 있다. 이 시리즈는 1998년 제1회 베를린 비엔날레에서 카베(KW) 현대미술 인스티튜트의 각 층을 훑어 내려오며 처음 선보인 뒤, 2006년 런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널따란 터빈홀을 굽이굽이 헤집었고, 2011년 뉴욕 뉴 뮤지엄New Museum을 3, 4층에서 2층으로 관통했다. 그가 줄곧 인용하는 프랑스 출신 평론가 로제 카유아Roger Caillois의 묘사에 따르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은 ‘안 그랬으면 또렷했을 정신을 덮친 일종의 육감적인 패닉’이다. 횔러가 증언하길,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관객의 얼굴표정은 하나같이 타기 전과 확연히 다르다. 관객은 이미 출발점과 도착점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 두 지점 사이를 잇는 찰나의 과정 속에서 마치 ‘자신을 잃는(losing yourself)’ 듯한 기분을 만끽한다. 특히 테이트 모던에서 선보인 ‘Test Site’(2006) 중 가장 큰 미끄럼틀은 6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55m 길이의 건축적 규모였다. 작가는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보다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미끄럼틀을 이동 수단으로 도시 건축에 도입하면 매번 지속되는 그 특유의 체험 때문에 사람들은 물론 사회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바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작품 'Y'는 인간이 되풀이하는 어리석음,
즉 지난 경험에 근거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괄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한다."
향수어린 흥분과 권태
2006년 미국 매사추세츠 매스 모카MASS MoCA에서 열렸던 횔러의 개인전 〈Amusement Park〉에는 5개의 실제 놀이 기구가 설치됐다. 다만 모든 기구는 1회 작동하는 데 1시간이 걸릴 정도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등 작동 시간이 변주됐다. 횔러는 이처럼 각종 탈것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물론 기계적 움직임, 야외 행사용 발광 전구 등 놀이공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작품에 빈번히 도입한다. 대표적인 작품이 회전목마를 활용한 ‘MirrorCarousel’(2005)이다. 놀이공원을 상기시키는 각종 장치는 지난 경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기대감과 환희를 자극하지만, 반대로 그 식상함 때문에 무료하고 권태롭기도 하다. 횔러의 작품은 이 대조적인 감정 속으로 관객을 몰아넣고 관객이 자신의 작품을 체험함으로써 그 양극단으로 치부될 수 없는 형언 불가능한 어떤 경험을 체득하도록 장려한다. 관객은 가는 둥 마는 둥 천천히 돌아가는 회전목마에 앉아 혹은 거기에 앉은 다른 관객을 바라보며 그 경험의 가치를 내심 저울질한다.
경험 앞에 놓인 선택
이 경험의 순간에 도달하기에 앞서 관객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토록 지극히 훤히 들여다보이는 경험을 해야 할 것인가?’ 작품 ‘Y’는 인간이 되풀이하는 어리석음, 즉 지난 경험에 근거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괄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한다. 2003년 제50회 베니스비엔날레 이탈리아관에 처음 선보인 이 작품은 제목처럼 ‘Y’ 형태의 통로다. 세 갈래로 갈라진 직선이 모여 이루어진 이 알파벳의 모양대로 입구는 하나지만 출구는 2개다. ‘Y’ 형태를 따라 사람이 지나다닐만한 크기의 원형 틀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고 각 틀 둘레에는 놀이 기구에 자주 사용하는 동그란 전구가 촘촘히 박혀 있다. 개별전구는 각기 다른 시간대에 깜빡이는데,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마치시계 방향으로 불빛이 돌아가고 있는 듯한 상황을 연출한다.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한다. 휘황찬란한 발광 터널 같은 이 작품 앞에 서면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 ‘이걸 통과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통과하기로 결심했다면 입구를 지나 갈림길이 나오는 중간에 서서 다음 행로를 선택해야 한다. 오른쪽 사선으로 난 출구든, 왼쪽 사선의 경우든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둘 중 한 출구로 나오면 다른 출구로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없다. 똑같아 보여도 겪지 못한 상대의 경험이 나의 현재 경험과 온전히 같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이 통로를 지나가지 않고 작품 주변을 돌아간다면 이 작품을 체험하는 다른 관객의 경험을 그저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횔러는 이 작품의 제목을 다소 어학적으로 접근한다. 스페인어로 ‘y’는 ‘그리고/-와’를 뜻하고, 영어로 ‘y’의 발음은 ‘왜(why)’와 같으며, 그리스어와 독일어로 알파벳 ‘y’는 ‘웁실론(혹은 입실론)’이라고 발음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y’를 선 혹은 악의 갈림길에 대한 상징으로 삼았기에 ‘피타고라스의 문자’라고도 불린다. 궁금증을 안고 어떤 선택을 통해 무언가를 하는 혹은 하지 않는 경험을 하고 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질문한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경험의 매력이자 딜레마다.
횔러는 한 인터뷰에서 과학계를 떠난 이유 중 하나로, 아무리 과학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모든 실험은 정체성이 각기 다른 과학자 개개인이 진행한다는 점에 대한 괴리를 꼽았다. 유머러스한 면이 없지 않은 그의 작품 전반은 계획, 이성, 예측 가능성 등으로 대변되는 어떤 세계의 거만한 팔짱을 풀고 한 팔을 당겨 경험의 현장으로 끌어들인다. 그 과정에서 이 실험 경험 혹은 경험 실험의 주체 및 대상은 각각 작가 및 관객이 아니라 모두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