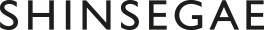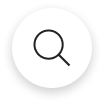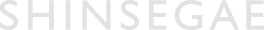매거진
궁극의 여행을 찾아서
2019/9 • ISSUE 17
베눈에 들어오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만이 전부는 아니다. 귀로 듣는 풍경, 즉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도 있다.
writerJang Eunsu 출판편집인, 문학평론가
눈꺼풀을 닫아 빛을 없애고, 호흡을 죽여서 바깥 소리에 집중하더라도 눈 오는 소리에 가닿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의 감각을 초월하지 않고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제까지 내 감각이 느꼈던 자리보다 한 걸음 더 걷고 한 계단 더 오르고 한 움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삶이란 얼마나 너덜너덜한가. 인생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누구나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다.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느리든 빠르든, 어느날 갑자기, 삶은 멈춘다. 인간은 누구나 시한부로 살아간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으로 끝난다. 하지만 허무하지는 않다. ‘지금 이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지속을 이루고, 지속을 한없이 이어붙임으로써 영원을 추구하는 예술적 삶이 덧없음의 덫에서 우리를 구출한다. 예술을 닮을 때 삶은 비약할 수 있다. 사락사락, 언어가 있다면 소리도 있다. 언젠가, 시인은 눈 내려 쌓이는 소리를 듣고 언어로 기록했다. 한 음악가는 이 소리를 실제로 포집하고 싶었다. 이렇듯 누군가는 불가능한 것을 기획하고 현실에서 꾸준히 시도한다. 실패를 누적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어느 순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미리 정해진 것은 없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 눈알에 의지하는 세계가 무너지고 고막이 힘을 쓰는 세계가 개벽하는것도 가능하다.
“예술을 닮을 때 삶은 비약할 수 있다.
사락사락, 언어가 있다면 소리도 있다.”
어떤 장소든 소리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여행은 소리의 여행이다. 현대 여행 문화는 시각과 미각에 치우쳐 있지만, 조선 선비들의 여행은 소리를 빼놓지 않는다. 〈관동별곡〉은 ‘소리의 기록’으로 첫걸음을 시작한다.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섯돌며 뿜는 소리 십리에 자자하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섯돌며’는 ‘섞여 휘돌며’라는 뜻이다. 멀리서 소리를 듣고 가까이서 경치를 구경한다. 〈열하일기〉는 어떠한가. 마지막 부분이 물소리로 가득하다. “일찍이 나는 문 닫고 누운 채 시냇물 소리를 듣고 견주어 나누어 본 적이 있었다. 깊은 소나무에서 울리는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청아한 까닭이며,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흥분한 까닭이며, 뭇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교만한 까닭이다.” 옛사람들은 자연을 볼 때 소리를 빼놓지 않았고, 때로는 풍경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를 맞추어 유람을 떠나기도 했다.
초원은 종달새 우는 봄날에 걸어야 활기를 뽐내고, 폭포는 여름 장마철 다음에 가야 제맛을 누리며, 언덕은 풀벌레 소리가 한창인 가을에 이르러야 아름다움을 알고, 깊은 숲은 겨울에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호수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한겨울 태양이 떠오름에 따라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이 갈라지면서 쩡쩡 노래를 부를 때다. 초가을 여행은 왜 하는가? 높은 하늘 밝은 달을 즐기며 이슬에 가랑이 젖는 줄 모르고 풀벌레 소리를 즐기려는 것이다. 바람에 솔숲이 울고, 부엽토는 뭉클한 향기를 뿜어내는데, 풀벌레들은 짝을 찾아서 우렁차게 노래한다. 시인의 귀가 열린다. “뭐가 쓸쓸해? 뭐가 쓸쓸해? 뭐가?! 뭐가?! 뭐가?!”
‘가을밤 2’에서 황인숙이 노래한다. 점층하는 질문이 여행자의 발을 붙잡는다. 초가을 벌레 소리는 외롭지 않고 청명하다. 벌레 울수록 쓸쓸함이 더하기는커녕, 즐거운 리듬이 일어선다. “명랑한 소름”이라는 시인의 이어지는 표현은 얼마나 적절한가. 여름의 후덥지근한 열기는 잦아들고, 상쾌한 바람이 벌레 소리와 어울려 밤마실을 부추긴다. 벌레들도 “소슬바람에 가팔라진 가슴/ 베어 물 듯”(‘가을밤 1’) 우는 늦가을과는 달리 운다. 소리 좋은 곳을 찾아서 어찌 온밤을 즐기지 않으랴. 보는 풍경이 아니라 듣는 풍경도 있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갔을 때다. 늦저녁에 갑자기 바깥을 보고싶어서 세 겹으로 껴입었다. 캠프장 불빛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저녁무렵 왔던 길을 한 걸음씩 걸어나갔다. 달은 얼마나 밝은가. 저 멀리서 만년설이 하얗게 빛났다. 온전한 어둠 속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머물고 싶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여민 방한 파카와 뒤집어쓴 모자가 거세게 펄럭거렸다. 세상에 온통 바람이 가득한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었다. 순간, 어디선가,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속삭이는 듯 가만한 숨소리가 이어졌다. 자박자박 발밑에서 땅이 울었다. 내 몸속의 소리를 이토록 자세히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신비하고 경이롭고, 말로 옮길 수 없는 심오한 느낌이 등뼈를 훑어 내려갔다. 신령한 산(靈山) 히말라야 한복판에서 산이 울부짖는 거센 소리와 내 몸이 내는 소리를 번갈아 듣는다. 처음엔 너무나 낯설었다.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평온한 확신이 찾아왔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여기, 이 얇디얇은 피부 밑에서 울려오는 소리로 나는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소리가 있다. 내부에서 박동하는 이 소리가 인간의 존엄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물리적으로 보증한다. 아무도 이 리듬에 함부로 간여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손댈 수 없다. 설령 우리가 평소 이를 전혀 지각하지 못할지라도, 피가 순환하고 심장이 두근대는 이 소리는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강도 높고 심오한 고독”(릴케) 속으로 들어설 때 우리 몸이 연주를 시작한다. 고요가 말을 걸어오는 곳에서 소리로 이루어진 정체성이 귀를 연다. 인간은 ‘소리의 생명체’다.